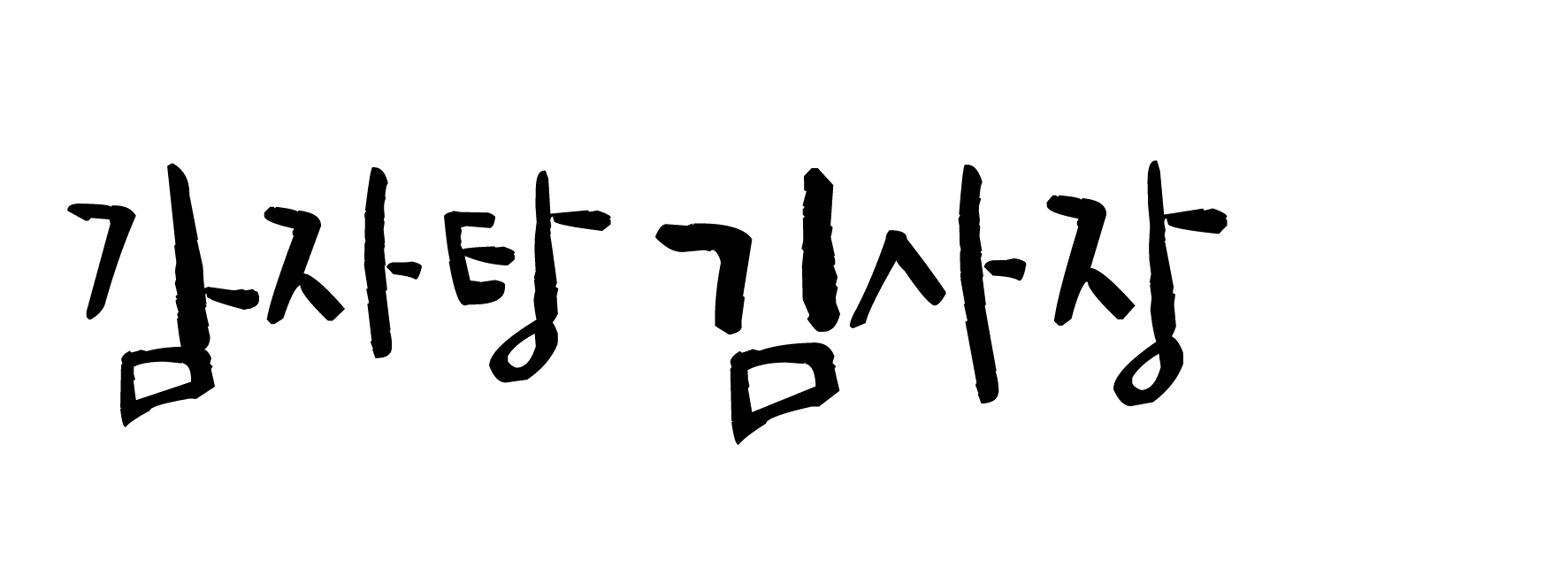우리 회사엔 부장님이 너무 많다 (feat. AI)
요즘 나는 감자탕 일의 연장선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 있다. 말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서 접근은 쉽지만,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코딩과 구조 설계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배우는 속도는 느리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은 AI라고 생각한다. 결국 배우는 속도보다 중요한 건, 그 배우는 과정을 통해 일을 다시 구조화하는 힘이니까.
지금 나는 AI로 만들어 놓은 수십 명의 ‘부장님, 과장님, 지점장님’들과 매일 의견을 나눈다. 그들은 늘 준비되어 있고, 감정의 기복 없이 일관된 태도로 조언을 준다. 나는 그들에게서 일의 관점을 배우고, 판단의 근거를 점검한다. 예전 같으면 사람을 새로 충원하고, 일을 가르치고, 대화를 나누며 감을 맞췄겠지만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부장님을, 새로운 과장님을 언제든 모실 수 있다. 이건 정말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기준이 필요하다. 어떤 일을 AI에 맡기고, 어떤 일은 내가 직접 해야 하는가. 어디까지가 ‘도움’이고, 어디서부터가 ‘의존’인가. 그래서 나만의 다섯 가지 기준을 정리해 두었다. 이 기준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일을 설계해볼 생각이다.
내가 AI를 도입하는 다섯 가지 기준
- 반복되는 피로한 판단이 누적될 때 → 동일한 결정을 반복해야 하는 루틴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초안을 맡긴다.
- 작업 시간을 30분 이상 줄여줄 때 (주간 기준) →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실제 시간을 ‘반환’해주는 수준일 때만 쓴다.
- 전문가의 간단한 의견이 필요할 때 → 빠른 관점을 얻어 판단의 방향을 잡고 싶을 때 활용한다.
- 결정의 근거가 필요할 때 → 감이 아닌 데이터나 사례로 선택을 검증해야 할 때, AI를 파트너로 둔다.
- 새로운 관점을 얻고 싶을 때 → 익숙한 사고 흐름을 흔들고,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보고 싶을 때.
이제 AI는 단순히 일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일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동료처럼 느껴진다. 물론 여전히 시행착오가 많다. 하지만 그 시행착오조차 나의 판단력과 일의 감각을 확장시켜 주고 있다. 감자탕처럼, 천천히 달이더라도 꾸준히 진해지는 과정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