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탕로그 1편. 왜 하얀 감자탕이었을까
내가 알던 빨간 감자탕
내가 알던 감자탕은 늘 빨간 국물이었다. 친구들과 술 한잔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메뉴였고, 칼칼한 국물에 뼈가 하나둘 쌓여가는 풍경이 감자탕의 매력이었다. 뼈에서 살을 발라 먹는 손맛, 마지막 남은 국물에 밥을 볶아 먹는 마무리까지.
감자탕은 맛있는 음식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음식이었다. 소주잔을 함께 기울이며 시간을 보내기 좋은, 어른들의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래서 감자탕을 떠올릴 때마다 질문은 늘 같았다. 더 얼큰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입에 더 감기는 맛은 없을까? 감자탕을 만든다는 생각조차 없던 시절이었지만, 감자탕의 기본은 ‘칼칼하고 중독적인 맛’이라고 믿었다.
오너셰프에서 딸 가진 아빠로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건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다. 결혼 10년 만에 첫 딸을 얻었고, 어렵게 얻은 아이를 자연 가까운 곳에서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오너셰프로 일하던 오산의 레스토랑을 정리하고, 처가가 있는 강릉으로 이사했다. 강릉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빨리 내 일상의 질문을 바꿔놓았다.
어느 날 장모님이 하얀 감자탕을 만들어주셨다. 그 국물은 내가 알던 감자탕과는 전혀 다른 음식이었다. 장모님이 40년 전부터 해오던 방식 그대로, 신선한 강릉 돼지 사골과 목뼈를 받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푹 끓여낸 국물이었다.
마침 아이의 이유식 시기와 겹쳐 그 국물에 뼈고기를 잘게 찢어 먹였는데, 아이가 너무 잘 먹었다. 그 모습을 보며 질문이 달라졌다.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가 아니라 누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일까. 셰프로서의 질문이, 아빠로서의 질문으로 바뀌었다.
강릉하얀감자탕이 특별해진 이유
그 질문은 곧 선택으로 이어졌다. 계획했던 식당 대신, 이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 온라인으로 팔아보자는 생각이었다. 강릉이라는 환경은 그 선택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
바다와 산이 함께 있고 공해가 적은 덕분에 좋은 재료를 직접 구할 수 있었다. 태백 산골에서 배추를 얻고, 정선에서 고추를 받아 방앗간에서 고춧가루를 빻았다. 강릉에서 돼지 잡는 날에 맞춰 사골을 받고, 강원 한우와 함께 식으면 묵이 되는 사골을 푹 끓였다.
그렇게 대관령을 오르내리며 몇 달을 고생한 끝에 하얀 국물 감자탕이 완성됐다. 아이를 위한 국물에 어른도 즐길 수 있도록 장모님의 다데기를 함께 넣어보내자 반응이 달라졌다.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어 좋다”, “재료의 신선함이 다르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첫 출하 때 새벽 가게에 혼자 앉아 주문 알림을 보며 벅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몇 달 동안은 몇 주씩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
마무리하며
하얀 감자탕은 트렌드를 따라 만든 음식이 아니다. 빨간 국물이 당연하다고 믿던 내가, 아이를 키우며 질문을 바꿨고, 그 질문에 답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결과다.
왜 하얀 감자탕이었을까? 답은 단순했다. 누구나, 특히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다는 것. 그 기준은 이후 강릉하얀감자탕의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시작에는 언제나 장모님이 끓이던 하얀 국물이 있었다. 그 국물은 왜 그렇게 시작되었을까. 그 이야기는 다음 기록에서 조금 더 꺼내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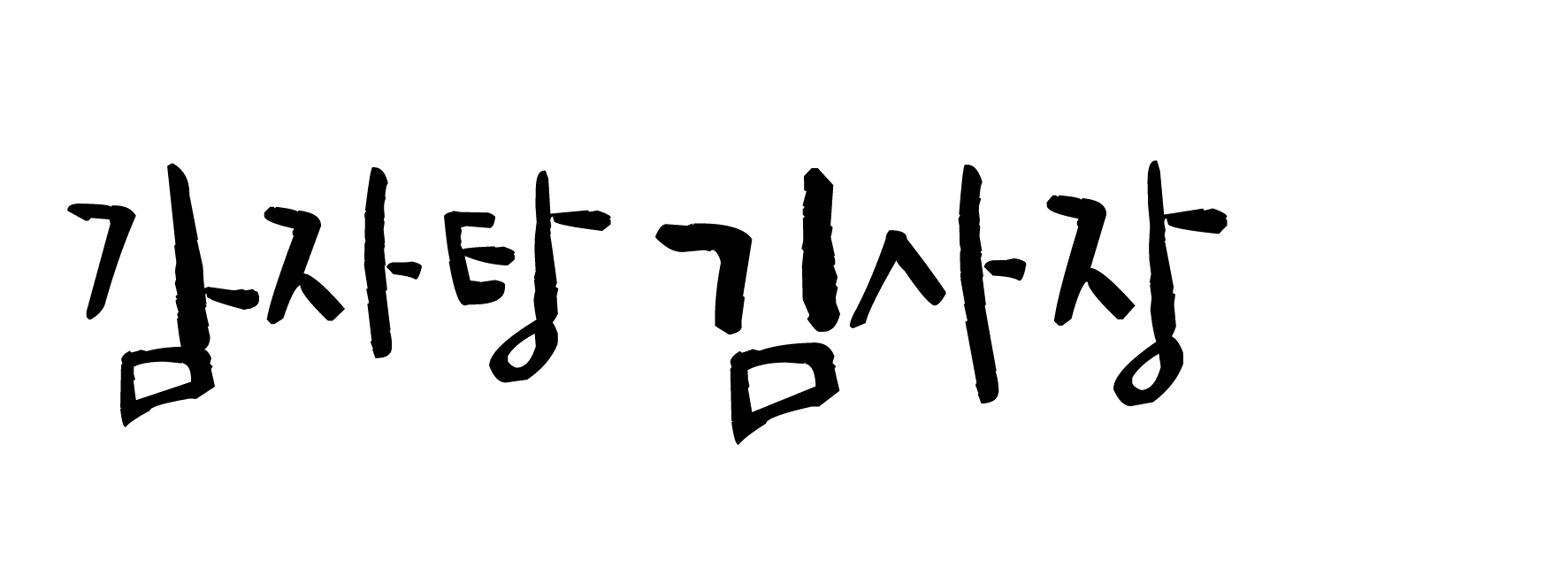











Leave a Reply
Want to join the discussion?Feel free to contrib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