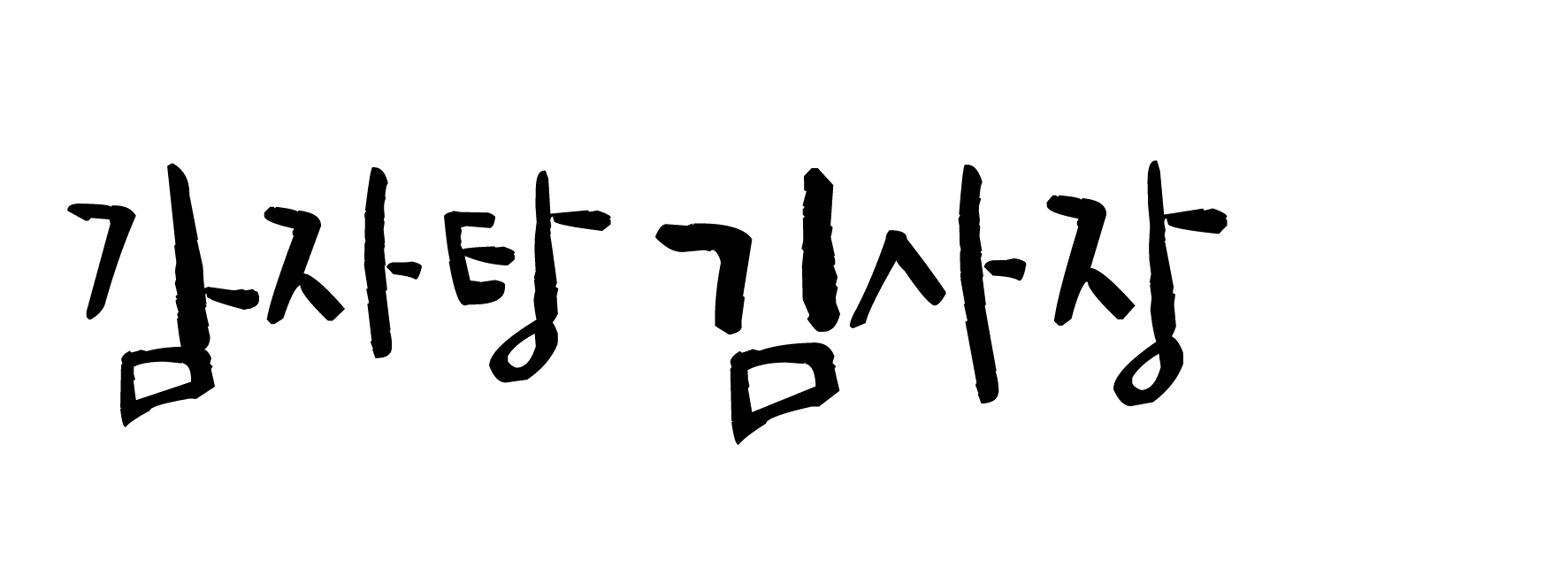‘의심의 연속’이 아니라, ‘믿음의 연습’ — 3km를 넘기까지
오늘 마음의 벽인 2km를 깨고, 드디어 3km를 뛰었다. 숫자만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나에게 이건 작은 혁명에 가까웠다. 2km를 넘기 전까진 늘 똑같은 패턴이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멈췄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내일 더 뛰면 되잖아.” 그렇게 합리화하며 멈추는 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나는 나를 너무 의심하며 달렸다. 이 거리쯤은 어렵다고, 내 체력이 거기까지는 안 된다고. 그런데 오늘 깨달았다. 그 과정은 ‘의심의 연속’이 아니라, ‘믿음의 연습’이었다는 걸.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걸 느꼈다.
오늘 처음으로 3km를 완주했다. 앞으로는 이 거리와 또 싸워야 한다. 할 수 있을까,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그만둬도 괜찮지 않을까 — 이런 생각들이 다시 머리를 스친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과정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그 치열함이 내 일상에 필요한 감각이라는 걸 안다.
나는 운동을 하며 ‘치열함’을 다시 배운다. 단순히 목표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의 한계를 관찰하고 대화하는 시간이다. 오늘 3km를 넘겼지만, 언젠가 4km, 5km로 나아갈 것이다. 그때마다 또 멈추고, 의심하고, 다시 뛰겠지.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나를 믿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안다.
3km는 숫자가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의 증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