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탕로그 2편. 장모님 국물에서 배운 것
하얀 국물의 시작은 기억이었다
하얀 국물 감자탕의 첫 아이디어는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아내의 기억에서 시작됐다. 어릴 적, 엄마가 자주 끓여주던 하얀 국물 이야기를 들려줬다. 맛있는 고기가 듬뿍 들어간 국물이었고, 네 남매가 함께 먹던 음식이었다고 했다. 자극적이지 않았지만 깊었고, 잡내 없이 고기도 부드러워서 막내까지 잘 먹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 정확한 레시피보다 “아이들이 잘 먹었다”는 말이 오래 맴돌았다. 그래서 딸에게도 한 번 먹여보고 싶어 장모님께 물었다. 그 국물의 정체는 특별한 양념이 아니라, 양념을 하지 않은 하얀 국물 감자탕이었다.
집밥에서 확인한 기준
장모님께 부탁해 한 솥 끓여 함께 먹었다. 신선한 강릉 돼지 사골과 목뼈를 푹 고아낸 국물이었다. 마침 아이의 이유식 시기와 맞물려, 그 국물에 뼈고기를 잘게 찢어 먹였는데 아이가 정말 잘 먹었다. 그 모습을 보며 확신이 생겼다. 이건 단순히 ‘순한 음식’이 아니라, 기준이 분명한 음식이라는 생각이었다.
이탈리안 오너셰프로 일하며 나는 늘 재료가 가진 맛을 해치지 않는 방향을 고민해왔다. 소스와 조미료를 덜 쓰고, 맛을 더하기보다는 남기는 쪽을 선택해왔다. 장모님의 국물을 보며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여겨왔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겹쳐졌다. 기술을 뽐내는 요리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아는 태도 같은 것들. 그 국물은 맛있는 경험이었고, 동시에 지금까지도 내가 붙들고 가고 있는 좋은 기준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었다.
기준은 그대로, 선택지는 넓게
하얀 국물은 아이에게 먼저 맞춰진 음식이었지만, 어른의 식사로도 충분히 성립해야 했다. 그래서 국물은 그대로 두고, 원하면 칼칼하게 즐길 수 있도록 별도의 다데기를 곁들이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더해졌다. 국물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가족 모두가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구조였다.
그때 분명해졌다. 장모님의 국물은 레시피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기준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자극 없이도 충분히 맛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었다.
결정을 밀어준 장면
강릉으로 이사 온 뒤, 솔직히 걱정이 많았다. 다시 식당을 해야 할지, 아니면 중앙시장에서 김밥이라도 팔아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가 하얀 국물을 먹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정리됐다. 이 음식을 만들어 팔아보자. 그것도 오프라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해본 적 없는 방식이었고 두려움도 컸다. 하지만 우리 아이와 조카들이 잘 먹는 모습, 그리고 강릉에는 믿을 만한 로컬 식재료가 많다는 사실이 그 결정을 떠받쳤다. 겁은 있었지만, 기준은 분명했다.
마무리하며
장모님의 국물은 내게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판단의 기준을 남겨주었다. 무엇을 더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했다. 이 기준이 이후 하얀 국물 감자탕을 상품으로 옮기는 과정의 중심이 되었다.
왜 이 음식을 만들기로 결심했는지, 그 이유는 거창하지 않았다. 아이가 잘 먹었고, 어른도 함께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늘 집밥이 있었다. 다음 기록에서는 이 기준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먹여보며, 어떤 말들이 남았는지를 이어서 정리해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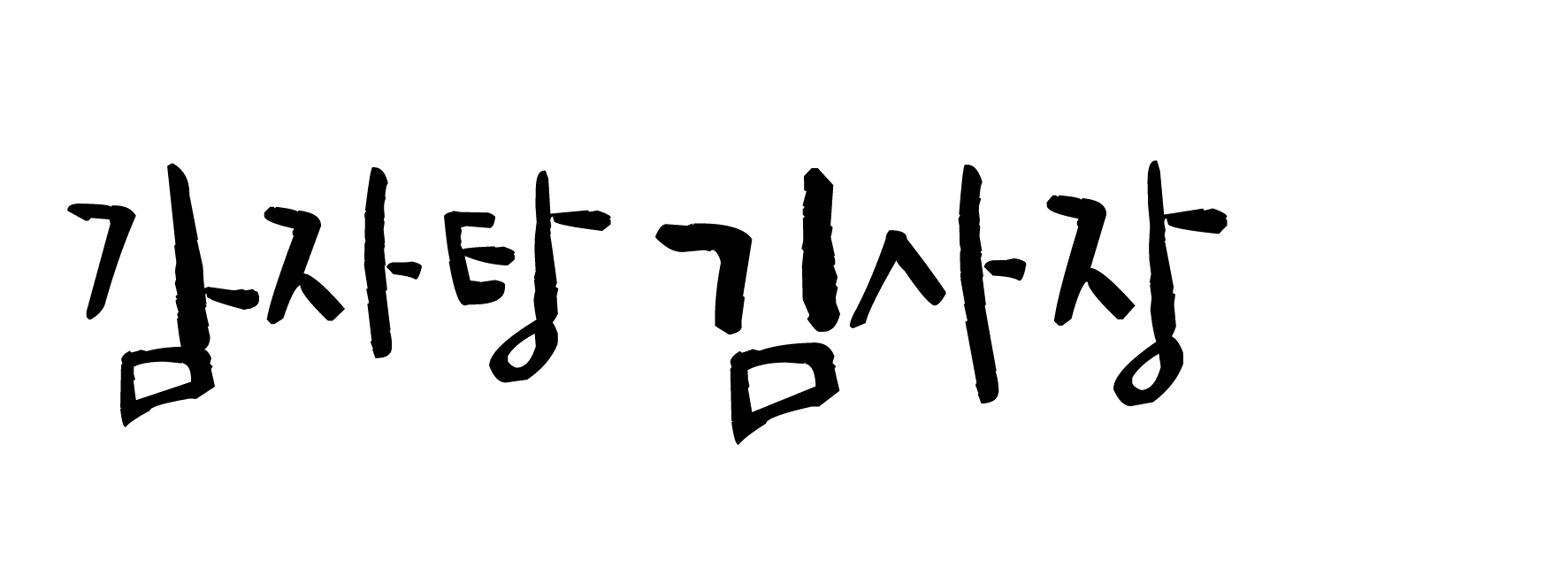











Leave a Reply
Want to join the discussion?Feel free to contrib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