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일하지만 혼자서 하지 않는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 모든 역할이 한 사람 안에 겹쳐졌다. 아침에 컴퓨터를 켜면 할 일이 끝없이 밀려 있고, 머릿속에서는 “뭐부터 하지?”가 하루 종일 맴돌았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일의 구조가 없어서 힘든 것이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내가 하는 일’을 전부 적어보는 것이었다. 기획, 생산, 포장, 고객 응대, 회계, 마케팅, SNS 관리, 제안서 작성 등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니 무려 스무 가지가 넘는 역할이 나왔다. 그 순간 웃음이 나왔다. “나는 한 명이지만, 사실은 스무 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셈이네.”
그때부터 일의 구조를 새로 짜보기로 했다. 각 역할을 구분하고, 그 자리에 AI를 보조자로 배치했다. 반복적인 일은 ‘AI 부장님’에게 맡기고, 아이디어를 정리하거나 초안을 만드는 일은 ‘AI 과장님’이 돕는다. 나는 기획과 판단, 그리고 고객과의 접점을 맡는다. 혼자 일하지만, 혼자서 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많은 자동화 관련 영상에서는 자동화를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술보다 먼저 업무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프로세스를 AI에게 맡길지, 어떤 일을 자동화할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으면 효율화는 불가능하다. 결국 자동화는 기술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5년째 이어온 감자탕 사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단순했다. 일의 경계가 생기면 생각도 정리된다. 예전에는 하루가 끝나도 뭐가 정리됐는지 몰랐다. 그런데 AI를 통해 역할과 과정이 분리되어 관리되자, 많은 것들이 명확해졌다. 무엇보다 ‘일을 처리한다’는 느낌보다 ‘일을 설계한다’는 감각으로 바뀌었다.
효율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일의 구조가 또렷해지자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해야 할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어떤 일을 해나가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서서히 감이 잡힌다.
예전에는 제안서를 쓸 때 하루를 통째로 쏟아붓곤 했다. 이제는 GPT가 초안을 만들고, 나는 수정하며 방향을 잡는다. 결과물을 문서화해 유기적으로 저장하고, 그것을 근거로 다음 일을 이어간다. 그러면서 속도는 빨라지고 품질은 오히려 좋아진다. 혼자 일하지만, 머릿속엔 작은 팀이 생긴 셈이다.
결국 1인기업의 핵심은 ‘모든 일을 내가 한다’가 아니라 ‘모든 일을 내가 조율한다’는 데 있는 것 같다. 일의 구조를 다시 세운다는 건 결국 나의 사고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졌다. “이 일을 내가 해야 하나?”가 아니라 “이 일은 누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돌아갈까?” 그 질문 하나가 나의 하루를 훨씬 가볍고 명확하게 만들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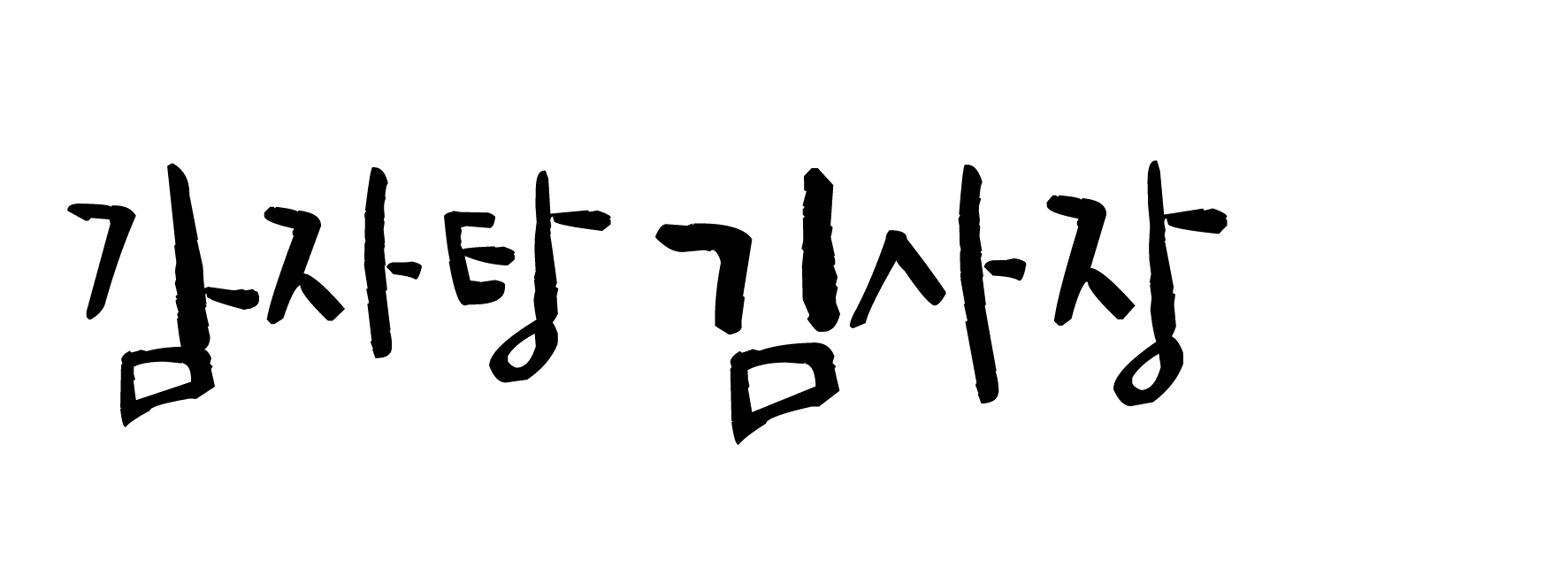












Leave a Reply
Want to join the discussion?Feel free to contribute!